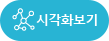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6401299 |
|---|---|
| 한자 | 媤- |
| 영어공식명칭 | Sijipsali Norae |
| 이칭/별칭 | 시집살이요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구비 전승 |
| 유형 | 작품/민요와 무가 |
| 지역 |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|
| 시대 | 현대/현대 |
| 집필자 | 윤성의 |
| 채록 시기/일시 | 1982년 - 「시집살이 노래」 채록 |
|---|---|
| 채록지 | 시집살이 노래 -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|
| 성격 | 부녀요 |
| 형식 구분 | 독창 |
[정의]
충청남도 당진시에 전해 오는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표현한 부녀요.
[개설]
옛날의 시집살이는 힘들고 서럽고 외로운 생활이었다. 낯설고 사람 선 섬 같은 시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고,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야말로 새댁이 섬이 되는 생활이다.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낯빛을 살펴 가며 살얼음 밟는 듯 아슬아슬한 날들의 연속이다.
오죽하면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삼 년, 장님 삼 년, 벙어리 삼 년이라고 했을까. 보아도 못 본 체, 들어도 안 들은 척, 입은 꾹 다문 채, 그러니 속은 얼마나 타들어 갈 것인가.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생활이 시집살이였다.
그렇다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었을까.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. 그래서인지 다른 민요에 비해 「시집살이 노래」는 흔치 않다.
[채록/수집 상황]
「시집살이 노래」는 1982년에 당진에서 채록하여 『당진군지』(당진군, 1983)에 수록하였다.
[구성 및 형식]
「시집살이 노래」는 혼자 시름에 겨워 부르는 독창 형식이다.
[내용]
1. 형님 형님 사촌 형님/ 시집살이 어떠한가/ 아이구야/ 고추 같은 다홍치마/ 눈물 닦다 다 삼았다/ 깨끼 깨끼 깨끼적삼/ 북두 명주 깃을 달고/ 달밤 초로 고름 달아/ 새벽달이 열이렛날/ 은 다리미 얻어다가/ 살곰살짝 다려서로/ 개랴 하니 손때 묻고/ 입을랴니 몸때 묻고/ 횃대 끝에 달아 놓고/ 들며 날며 보쟀더니/ 열 살 먹은 시누이가/ 발기발기 찢어 놨네/ 천석을 바라고 내가 왔니/ 만석을 바라고 내가 왔니/ 샛별 같은 네 오래비 하나 바라고 왔더니/ 얼떨떨 거리고 나 돌아간다
2. 형님 온다 성남 온다/ 분고개로 성님 온다/ 형님 마중 누가 갈까/ 형님 동생 내가 가지/ 형님 성님 사촌 형님/ 시집살이 어떻던가/ 이애이애 그 말 마라/ 시집살이 개집살이/ 앞밭에는 배추 심고/ 뒷밭에는 고추 심어/ 고추당추 맵다 해도/ 시집살이 더 맵더라/ 둥글둥글 수박 심기/ 밥 담기도 어렵더라/ 두리두리 두리 소반/ 수저 놓기 어렵더라/ 오리 우물 길어다가/ 십리 방아 찧어다가/ 아홉 솥에 불을 때고/ 열두 방의 자리 걷고/ 외나무다리 어렵대야/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/ 나뭇잎이 푸르대야/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/ 시아버지 호랑새요/ 시어머니 꾸중새요/ 동서 하나 할림새요/ 시누이 하나 뾰죽새요/ 시아주비 쁘릉새요/ 남편 하나 미련새요/ 자식 하난 우는 새요/ 나 하나만 썩는 샐세/ 귀먹어서 삼 년 새요/ 눈 어두어 삼 년 새요/ 말 못해서 삼 년이요/ 석삼년을 살고 보니/ 배꽃 같은 요내 얼굴/ 호박꽃이 다 되었네/ 백옥 같은 요내 손길/ 오리발이 다 되었네/ 열새 무명 반물치마/ 눈물 씻기 다 썪었네/ 울었던지 말았던지/ 베개 너머 소이졌다/ 그것도 소이라고/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/쌍쌍이 떠돌아 오네
[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]
옛날에는 시집살이가 혹독하여 귀머거리 3년, 벙어리 3년, 소경으로 3년을 살아야 한다고 할 만큼 하고 싶은 말 못하고, 눈에 거슬리는 것도 못 본 체하고, 귀에 거슬리는 말도 못 들은 척하고 살아야 했다고 한다. 이 노래도 그러한 정황을 넋두리처럼 혼자 읊조리는 민요다.
[현황]
요즘은 결혼한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물론 여타의 사회적인 관계들도 이 노래에 등장하는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으니 자연스레 「시집살이 노래」도 불리지 않고 있다.
[의의와 평가]
「시집살이 노래」를 통해 우리 선대 여인네의 시집살이 서러움을 음미해 볼 수 있다.
- 당진군지 편찬 위원회, 『당진군지』(당진군, 1997)
- 한국민속대백과사전: 시집살이노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