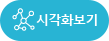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6700269 |
|---|---|
| 한자 | 交可驛 |
| 영어공식명칭 | Gyogayeok |
| 분야 | 역사/전통 시대 |
| 유형 | 지명/고지명 |
| 지역 | 강원도 삼척시 |
| 시대 | 조선 |
| 집필자 | 유재춘 |
| 비정 지역 | 교가역 -
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
|
|---|---|
| 성격 | 역 |
[정의]
조선시대 삼척 지역에 소재한 역.
[개설]
교가역(交可驛)은 조선 초기 3개 역로 가운데 평릉도에 속한 역의 하나이자 삼척도호부에 속한 5개 역 가운데 하나였다. 18세기 교가역은 찰방이 주재하는 평릉도 본역이었다.
[형성 및 변천]
조선 초기 강원도의 역은 보안도(保安道), 대창도(大昌道), 평릉도(平陵道) 등 3개 역로에다 속역이 57개였다. 그러다가 고려 말 조선 초에 여러 곳의 역을 통합 또는 이설하거나 명칭의 개칭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. 그 후 1455년(세조 1)에 대창도와 보안도를 합하여 대창도라 하고 찰방(察訪)을 파견하였다. 그후 역로는 점차 정비되어 1462년(세조 8) 8월에 은계도(銀溪道 )[속역 17, 찰방], 보안도[속역 30, 찰방], 평릉도[속역 15, 역승], 상운도(祥雲道)[속역 16, 역승] 등 4개 역로로 개편되었다. 이러한 속역의 수는 『세종실록지리지』에 기재되어 있는 3개 역로, 57개 역에 비하면 21개 역이 늘어난 것이지만 이는 실제로 역이 증설된 것이 아니다. 동(同) 지리지의 지역별 기록에 나타난 역수가 총 79개에 이름으로써 유사한 수에 불과하다. 세조 대에 정비된 역도는 『경국대전』에 거의 그대로 기록되었다.[4개 역도, 속역 78] 이는 일부분 역의 신설이나 이전 등이 있었지만 대체로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. 교가역(交可驛 )[‘交柯’로도 표기됨]은 조선 초기 3개 역로에서 평릉도에 속한 역 가운데 하나이자 사직(史直), 평릉(平陵), 용화(龍化), 옥원(沃原)과 함께 삼척도호부에 속한 5개 역의 하나였다. 옛 명칭은 교하(橋河)이다. 『경국대전』에서는 평릉도에 속한 15개 역 가운데 하나였으며, 조선 후기에는 삼척에 속한 6개 역[기존 역에 신흥역 추가] 가운데 하나였다. 18세기 중반경에 교가역은 찰방이 주재하는 평릉도 본역(本驛)이었다. 여기에는 대마(大馬) 1필, 기마(騎馬) 2필, 복마(卜馬) 8필, 역리 70명, 역노(驛奴) 16명, 역비(驛婢) 7명이 소속되어 있었다.
[위치 비정/행정 구역상의 구분]
교가역은 현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다.
- 『여지도서(輿地圖書)』
- 『강원도사』13-교통·통신(강원도사편찬위원회, 2015)